2025년 10월호 칼럼 벽 없는 집, 열린 마음 사모아 팔레가 전하는 삶의 지혜
벽 없는 집, 열린 마음
사모아 팔레가 전하는 삶의 지혜
글·사진 박춘태 박사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하늘 사이로,
구름이 낮게 걸린 수평선을 따라가다 보면
작은 섬나라 사모아(Samoa)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도 위에서는 손가락 끝으로도 가리키기 힘든
점에 불과하지만, 이곳에는 수천 년에 걸쳐 사람과
자연이 함께 빚어온 삶의 지혜가 깊게 깃들어 있다.
남태평양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
사모아는 1914년 독일령이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뉴질랜드가 통치를 시작했다. 1962년 독립할 때까지 뉴질랜드와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 뉴질랜드에서 비행기로는 약 6시간 반 거리이다. 이곳에 도착한 이들이 가장 먼저 눈길을 빼앗기는 것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변에 늘어선, 원형 혹은 타원형의 전통 가옥 ‘팔레(Fale)’다. 팔레 앞에 앉으면 곧장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집에는 벽이 없다.”
둥글게 둘러선 나무 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곧추서고, 그 위에 야자 잎과 코코넛 섬유로 엮은 지붕이 부드럽게 펼쳐져 있다. 새들이 잠시 머물다 날아가고, 바다는 시시각각 빛깔을 바꾸며 집 안에 스며든다. 아이들이 달려 들어오면 바람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와 온몸에 신선함을 묻힌다. 벽이 없으니 사방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은 시간을 따라 부드럽게 기둥을 돌며 움직인다. 빗방울조차 두려운 손님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스쳐지나가는 자연의 일부로 여겨진다. 집이 자연을 막지 않고 그대로 품어내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미 작은 울림을 느낀다.
공동체의 심장, 팔레
팔레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곧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며 공동체의 심장이다. 한 팔레 안에서는 하루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흐른다. 새벽이면 어른들은 모여 앉아 바다로 나가기 전에 서로 안부를 묻고 아이들은 기둥 사이에서 웃음을 터뜨린다. 정오가 가까워지면 이웃이 자연스레 들어와 함께 음식을 나눈다. 벽이 없으니 굳이 초대한 적 없어도 누구든 집 안으로 흘러들어온다. 저녁이 되면 오래된 이야기와 노래가 팔레 안에서 울려 퍼지고 그 소리는 해변을 넘어 바다로 퍼져간다. 사모아의 집은 ‘내 것’과 ‘네 것’으로 나뉘지 않는다. 벽이 없다는 사실은 곧 타인에게 닫히지 않는 삶을 뜻한다. 혼자가 아닌 함께를, 소유가 아닌 나눔을, 고립이 아닌 연결을 가능케 한다.
세월을 이어온 지혜
팔레의 역사는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진 건축 방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질서, 신뢰의 맺음법, 관용과 협동의 철학이 담긴 살아 있는 문화 전승이다. 팔레를 짓는 날이면 마을이 하나의 몸처럼 움직인다. 누군가는 숲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고 누군가는 잎을 엮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기둥을 다듬는다.
아이들도 작은 손으로 잎을 모으며 함께한다.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는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벽 없는 집은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의 것이고 따라서 그 속에서의 삶 또한 공동체의 언어로 쓰여진다. 팔레를 마주할 때 한국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것은 아마 오래전 시골 마을의 풍경일 것이다. 여름밤 마당 한가운데 돗자리를 깔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수박을 나누던 시절, 대문은 늘 활짝 열려 있었고 이웃은 언제든 드나들며 소식을 나누었다. 골목 어귀마다 아이들의 웃음이 흘러나왔고 사랑방에는 으레 누구 하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팔레는 낯선 듯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존재했던 ‘열린마음의 기억’을 건드린다. 마을 사랑방, 골목의 품, 언제든 들어설 수 있었던 열린 문. 그것들이 잊힌 듯 사라져가는 지금 팔레는 우리 기억 속 잔잔한 불씨를 새삼 일깨운다.
사모아의 토수아 오션 트렌치(To Sua Ocean Trench)
현대 사회의 수많은 벽
오늘날 우리의 집과 사회는 팔레 와는 대조적이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대문, 출입을 통제하는 비밀번호, 아파트의 두꺼운 벽은 소리를 차단하고 이웃의 얼굴을 모르게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세대 간 격차, 이념의 갈등, 부와 빈곤의 간극 같은 수많은 벽이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다. 보이지 않는 심리적 벽은 더 높다. 소통 대신 침묵, 이해 대신 오해, 연결보다 단절을 택하는 순간들. 우리는 벽을 세우는데 열심이지만 그 벽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곤 한다.
진정한 건강한 사회는 벽을 세우는 데서 오지 않는다. 벽을 낮추고 마음을 여는 순간에야 공동체는 살아난다. 사모아 팔레가 던지는 교훈은 명쾌하다. 개인적인 면에서는 ‘나는 마음속에 어떤 벽을 세웠는가?’ 공동체적 면에서는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얼마나 가깝게 느끼며 사는가?’ 사회적면에서는 ‘닫힌 효율만 추구하는가, 아니면 열린 신뢰 위에 창의와 협력을 세우는가?’ 팔레는 말없는 건축이지만 우리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촉구한다. 닫힌 마음은 고립을 낳지만 열린 마음은 신뢰와 관용을 탄생시킨다. 한 채의 팔레에서 사람들이 모여 웃고 나누듯, 사회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때 살아 움직인다.
바람처럼 스며드는 삶
팔레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바람이 기둥 사이를 스치며 들어오는 찰나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드나드는 통로처럼 느껴진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파도 소리와 어우러지고 어른들의 담소는 바람결에 흩어져 이웃집으로 자연스레 퍼져간다.
사모아에 있는 간단한 초가집 비치 팔레
여기에 찾아온 낯선 이도 배제되지 않는다. 그는 누구인지 묻기도 전에 자리를 받고 함께 음식을 나눈다. 벽이 없으니 ‘안’과 ‘밖’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결국 사람은 하나의 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팔레 앞에 앉으면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묻는 듯하다. “너는 네 삶 안에 몇 겹의 벽을 세웠는가?” “너의 집은 사람을 들이는가, 아니면 막아서는가?” “네 마음은 열린 바람처럼 흐르는가, 아니면 닫힌 방처럼 갇혀 있는가?” 그 질문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따뜻하다. 벽을 허무는 일은 두려움도 동반하지만 그 너머에는 늘 예기치 못한 기쁨과 연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벽 없는 집, 벽 없는 마음
사모아의 팔레는 단순히 전통 가옥이 아니다. 그것은 수천년에 걸쳐 인간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우리가 세운 벽은 안전과 편리를 가져다줄 수 있지만 동시에 타인과 나를 갈라놓는다. 반대로 팔레처럼 벽을 걷어낼때 삶은 바람처럼 시원해지고 따스해진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 사모아에서 들려오는 벽 없는 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진정한 집은 벽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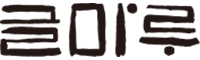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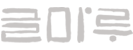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