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호 역사 전 세계가 열광한 Oh~my ‘갓’
전 세계가 열광한
Oh~my ‘갓’
글 백은영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 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부모님께 받은 몸을 소중히 지키는 것을 효(孝)라 생각하며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르지 않았다. 외려 머리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으며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다. 그 옛날, 멋을 위한 것도 있지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자를 즐겨 썼으니 그중 하나가 바로 ‘갓’이다.
지금은 사극에서나 볼 수 있던 ‘갓’이 지구촌을 한숨에 사로잡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2025)’ 열풍과 함께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케데헌’ 열풍은 갓이나 한복과 같은 한국 전통문화는 물론 김밥이나 국밥과 같은 K-푸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전 세계인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특히 극중 ‘사자보이즈’가 머리에 쓰고 나온 ‘갓’은 중국 일부 인플루언서와 네티즌에 의해 “중국이 원조”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더욱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토록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갓’, 그것이 궁금하다.
한국의 멋을 담은 ‘갓’
갓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대표적인 관모(官帽) 가운데 하나였다. 원래는 햇볕이나 비, 바람 등을 가리기 위한 실용적인 쓰개로 사용했으나 재료, 형태, 제작법 등이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사회적 신분 등을 반영하는 관모가 됐다.
갓은 머리를 덮는 부분인 모자(帽子)와 얼굴을 가리는 차양 부분인 양태(凉太)로 이루어졌으며, 형태상으로 모자와 양태의 구별이 어려운 방갓형(方笠型)과 구별이 뚜렷한 패랭이형(平凉子型)으로 나뉜다.
넓게 보면 방갓형(삿갓·방갓·전모)과 패랭이형(패랭이·초립·흑립·전립·주립·백립) 모두를 ‘갓’이라 부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갓’은 대개 흑칠한 흑립을 뜻한다. 패랭이와 초립의 단계를 거쳐 완성된 흑립은 조선 사회의 전형적 관모로 정착했고, 사대부부터 서민까지 폭넓게 쓰였다. 상투를 틀고 망건과 탕건 위에 올려 외출과 의례에 갖추는 마지막 품목이 바로 갓이다.
머리 위로 사뿐히 내려앉아 고아함을 더하고, 먹빛의 절제된 광택과 얼굴 위로 얇게 번지는 그림자는 한국적 멋을 가장 단정하게 드러냈다.
용도에 따라 색을 달리해 붉은 옻칠의 주립은 무관 당상관의 융복에, 백립은 상장례와 국상기에 쓰였으니 갓은 곧 위엄과 체모의 언어였다. 그 언어를 둘러싼 해학과 풍자는 민담과 속담을 낳기도 했지만 일상의 도덕과 예법을 단단히 묶는 역할도 했다.
갓은 대개 세 장인이 협업해 만드는 복합 공예다. 윗부분(총모자)을 짜는 ‘총모자장’, 챙(양태)을 만드는 ‘양태장’, 두 부분을 결합·마감하는 ‘입자장’이 각기 맡아 하나의 갓을 완성했다.
신분의 상징이 된 ‘갓’
갓의 역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입형백화피모(笠形白樺皮帽), 고구려 고분인 감신총 벽화에서는 모자와 양태의 구별이 뚜렷한 패랭이형의 갓을 쓴 수렵인물을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 신라 원성왕이 꿈에 복두(幞頭)를 벗고 소립(素笠)을 썼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도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려시대에 와서는 관리들의 관모로 제정됨으로써 신분이나 관직을 나타내는 사회적 의의를 가지게 됐다. 1357년 문무백관의 착립, 1367년 정3품 이하 흑립 장식 규정, 1374년 재상과 각문까지의 착용 명령으로 갓은 신분과 관직의 징표가 된다.
갓 만드는 모습(출처: 기산 김준근 풍속화)

조선시대 성인 남자들이 외출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예복 중 하나인 갓
(출처: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갓일(입자장) 보유자 박창영 선생의 작업 모습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사이 관모는 패랭이와 초립의 단계를 거쳐 마침내 흑립으로 자리 잡았다. 태종 대에는 한때 백관들이 갓을 쓰고 궁궐을 드나들었으나 “비도 눈도 내리지 않는 날에 관리들이 갓을 쓰고 조정길을 오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듬해부터 조정 예복은 사모로 정해지고 갓은 편복에 착용하는 옷차림으로 구분됐다. 이후 여러 관모 가운데 갓이 가장 폭넓게 쓰였으며 특히 양반층이 즐겨 착용했다.
패션의 완성은 ‘갓’
요즘 사람들 사이 우스갯소리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옛날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 패션의 완성은 ‘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의관(衣冠)을 정제한다는 말이 있듯 ‘갓’은 예(禮)의 완성이자 선비의 기품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징이었다.
비록 지금은 역사물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 문중의 행사 때에나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갓’은 때와 장소, 신분에 따라 그 모양과 크기, 색깔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유행을 타기도 했다.
갓의 구조는 위가 좁고 아래가 조금 넓은 원통형 모옥(총모자)과 아래로 은근히 우그러진 곡선의 양태, 이를 머리에 단단히 고정하는 갓끈(입영)으로 이뤄진다. 재료와 마감에 따라 등급도 분화됐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죽사로 모자와 양태를 네 겹 엮고 촉사를 한 올씩 입혀 칠한 ‘진사립’은 왕과 귀인의 극상품이었다.

(출처: 뉴시스)
이외에도 말총 총모자에 죽사 양태·촉사를 올린 ‘음양사립’, 양태 위를 생초로 입힌 ‘음양립’, 명주나 얇은 베를 입힌 ‘포립’, 모자와 양태 모두를 말총으로 엮은 ‘마미립’까지 갓은 품계와 예법에 따라 착용 권한이 엄격히 갈렸다.
갓끈의 세계는 또 다른 품격의 장식사다. 포백영(헝겊)에서 주영(옥·마노·호박·산호·수정 등 보석), 죽영(대나무)에 이르기까지 갓끈을 장식한 재료가 곧 신분이나 마찬가지였다.
세종 때는 옥·마노류를 당상관 이상으로 제한했고 <경국대전>과 <대전회통>을 보면 금정자·옥정자·은정자 등 정자(頂子)의 재료를 품계별로 규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옥로립처럼 갓마루에 옥으로 만든 백로를 얹은 장식은 의식 때 융복이나 군복에 착용하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신이 착용했다. 갓을 쓰지 않을 때는 문양을 더한 갓집에 모셔 방안치레로 삼았으니 관모는 곧 집안의 격을 보여주는 기물이었다.
한편 갓은 고려 말 때부터 착용하기 시작해 조선 초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발달했다. 15~16세기에 들어서면서 갓 모양도 커졌으며 영조와 정조 때는 양태가 71~73㎝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다가 철종 때 45㎝ 정도로 작아지면서 고종 때 의복간소화를 하면서 더 줄어들었다. 양태뿐만이 아니다. 양태 위로 볼록 올라온 모자의 둘레와 높이도 각양각색이다. 선조 때는 24㎝까지 높아졌다고 하니, 갓 하나에도 멋과 풍류를 담았던 우리 선조들의 안목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
1984년 단발령이 시행됐지만 갓은 여전히 착용됐으며, 1895년에는 천인층에게도 갓 착용이 허용되고 패랭이는 금지되면서 귀천의 경계가 흐려졌다. 일제강점기에도 예장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늘도 두루마기와 갓의 조합은 한국적 미감의 정수로 전승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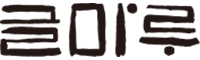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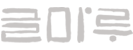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